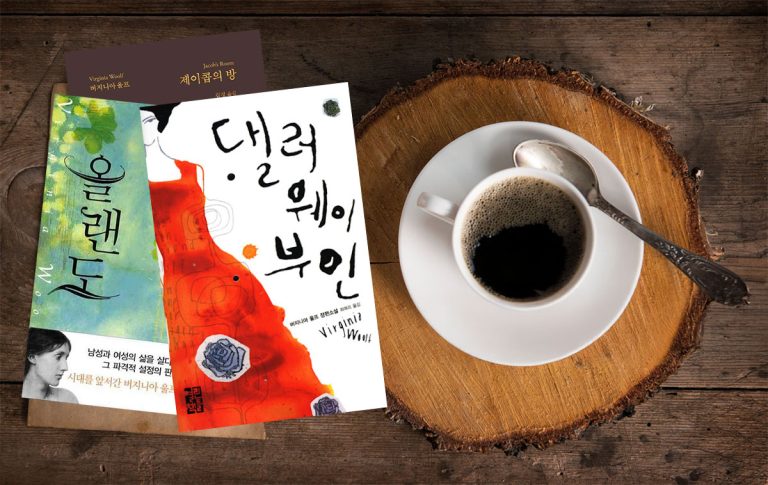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태어날 때 얻은 고유한 이름 외에도, 누군가의 자식, 친구, 연인, 그리고 배우자, 부모라는 이름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 이름들이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문득, 그 이름들 속에서 ‘진짜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진짜 색깔과 이름을 찾아 나선 한 사람, ‘바이올렛’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세상에 나를 설명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다
바이올렛 씨에게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수진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깨우고, 남편이 퇴근하면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댁에 전화를 걸면 ‘큰 며느리’가 되었고, 아파트 부녀회에 가면 ‘1302호 아줌마’로 불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 가족들의 스케줄로 빼곡한 달력. 그녀의 세상은 단단하고 평온했지만, 그 어디에도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역할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녀 자신도 그 사실을 잊은 채, 혹은 애써 외면한 채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주부예요”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주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자이자, 협상가, 위기관리 전문가, 그리고 따뜻한 상담가인 그 자리를, 그녀는 스스로 ‘그냥’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스케치북, 잊고 있던 나의 색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던 바이올렛 씨의 손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상자를 열자 희미하게 곰팡내와 함께 잊고 있던 과거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결혼 전, 디자이너를 꿈꾸며 밤을 새워 그렸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죠.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풋풋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림들이, 미완성된 디자인 시안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툰 글씨로 쓰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나만의 색으로 물들일 거야.”
그 순간, 바이올렛 씨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스케치북을 끌어안은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으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하다
그날 이후, 바이올렛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동네 문구점에서 작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한 세트를 샀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식탁에 앉아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분에 핀 제라늄을, 다음에는 창밖의 달을,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자신의 손을 그렸습니다.
대단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고 있던 자신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것뿐이었죠. 그러다 용기를 내어 익명의 SNS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Violet’s Room’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작은 그림과 짧은 생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창이었으니까요.
놀라운 일은 그 작은 창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그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림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렛 씨는 처음으로 ‘수진이 엄마’나 ‘최 과장 아내’가 아닌, 오롯이 ‘바이올렛’으로서 타인과 연결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바이올렛 씨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이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바이올렛’이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이름이 생겼습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먼지 쌓인 스케치북 하나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신의 가장 깊은 서랍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